"챗GPT 부정행위 6년간 4건"…대학들 F 처리로 경고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대학가의 디지털 시험 관리와 학사 윤리 기준이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가 최근 6년간 학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를 집계한 결과, 챗GPT를 비롯한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사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와 교육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일상 도구로 자리 잡는 속도에 비해, 대학의 평가 체계와 윤리 규범 정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학 학부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교는 49개교, 사례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복 집계를 포함한 유형별 통계를 보면 문제와 답안을 공유한 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받지 않은 자료 활용이 48건, 전통적 방식의 커닝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대리 응시, 표절, 응시자 간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포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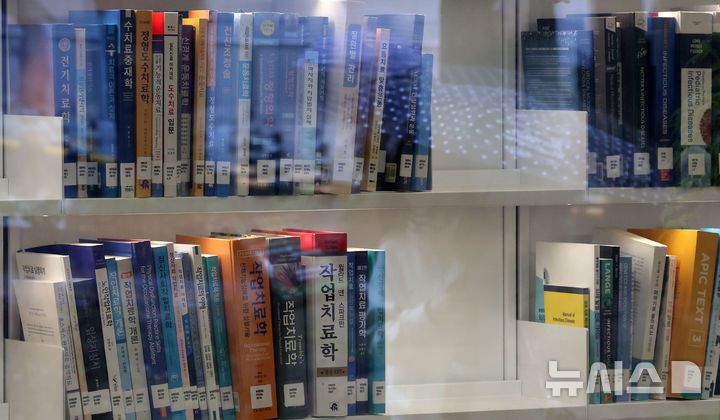
생성형 AI와 각종 전자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챗GPT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기타 전자기기, 인터넷을 시험 중 허가 없이 이용한 사례는 총 42건으로 전체의 18.8퍼센트를 차지했다. 대학이 IT 기기를 강의와 과제에 폭넓게 도입하는 흐름 속에서, 시험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기존 관리 방식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논쟁이 따라붙고 있다.
챗GPT를 직접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가톨릭꽃동네대, 부산대, 제주대, 조선대에서 총 4건 보고됐다. 모두 학점 F 처분이 내려졌으며, 일부 학생은 성적 처리와 별개로 윤리 교육이나 징계 조치도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 활용이 기존 표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만큼, 많은 대학이 가장 강한 수준의 성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윤리 교육과 사회봉사, 근신, 정학, 성적 변경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생성형 AI 사용을 시험 부정행위, 과제 표절, 학습 보조로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AI 활용을 원천 금지하는 대신, 출처 표기와 사용 범위 공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학사 규정을 손질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학습 도구이자 잠재적 부정행위 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만큼, 기술적 차단보다 평가 설계와 윤리 교육 강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객관식 중심 시험만으로는 AI·검색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서술형 평가나 구술, 프로젝트 기반 평가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생성형 AI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 학습 도구가 되고 있다며,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시험과 과제에서 어떤 사용이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부정행위가 되는지, 대학과 학생이 함께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도 AI 활용 역량을 요구하는 만큼, 대학이 기술 활용 교육과 학사 윤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계와 교육계는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고등교육의 방식과 평가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학문적 정직성과 공정성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본다. 대학이 어떤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생성형 AI가 학습 혁신 도구가 될지, 새로운 부정행위 위험 요소로 남을지가 갈릴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의 빠른 확산 속도에 맞는 제도와 윤리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