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I 인재가 연구 주도”…미국, 이민 단속 강화 땐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현지시각 기준 19일, 미국(USA) 뉴욕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이동과 관련한 분석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는 중국(China) 출신 AI 연구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이민 규제와 실리콘밸리 내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핵심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석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재 흐름이 미국의 AI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최근 보고서와 논문 토론 플랫폼 알파아카이브(alphaXiv)의 최신 분석은 중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AI 연구자가 미국 내 연구 현장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지시각 기준 2018년 이후에도 미중 공동연구가 다른 어떤 국가 조합보다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간 협력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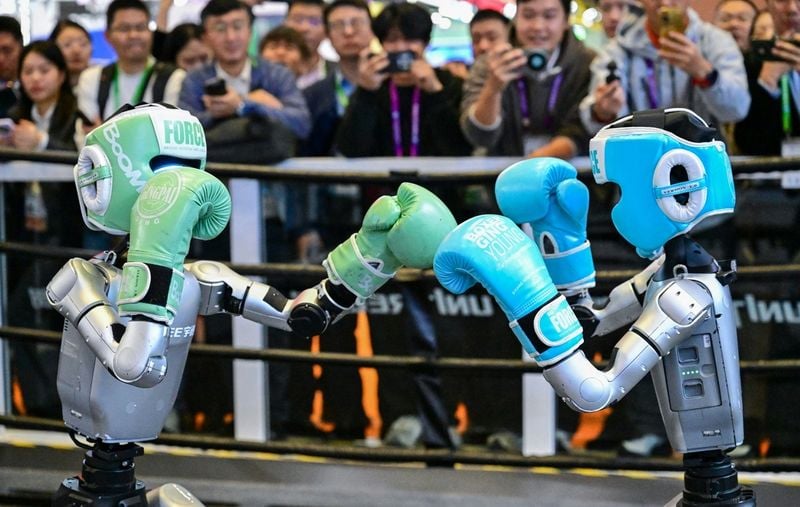
연구진은 먼저 2020년 폴슨연구소가 발표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상황 변화를 추적했다. 당시 폴슨연구소는 중국인 AI 연구자가 전 세계 상위권 AI 인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들 상당수가 미국 기업과 대학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EIP는 이 가운데 미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분류된 중국인 AI 연구자 상위 100명을 다시 추적한 결과, 87명이 현재도 미국 내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미중 관계 악화와 각종 비자·이민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핵심 인재 다수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연구에 모두 참여한 애널리스트 매트 시한은 미국 AI 산업이 중국 인재 유입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 중국인 최상위 연구자가 석박사 과정과 연구직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하고 일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제도적 장애 요인이 커졌음에도 “계속 미국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데 있어 인재 흡수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알파아카이브 보고서는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미중 간 연결성을 부각했다.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 연구진이 함께 수행한 AI 공동연구는 다른 어떤 양자 조합보다도 자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안보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에서는 상호 의존적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빅테크 업계 사례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발표한 ‘초지능 연구소’ 프로젝트에 합류한 AI 연구자 11명 가운데 7명이 중국 출신으로 확인됐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의 최전선 프로젝트에 중국인 연구자가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재 국적과 안보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연구자가 미국 기업의 기밀을 유출해 중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구 인력의 충성심과 정보보호 문제를 둘러싼 민감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여러 분석가들은 “정보 유출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중국 인재를 채용하고 협업하며 얻는 혁신·경쟁력 측면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중국 출신 인재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와 이민 단속 정책은 현재도 워싱턴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CEIP와 알파아카이브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기조가 확대될 경우 미국의 AI 연구 역량과 산업 경쟁력에 구조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재 유입이 제한되면 기업·대학 연구실이 추진하는 최첨단 프로젝트의 속도가 늦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헬렌 토너 미국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임시 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규제와 단속 강화 움직임이 “미국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누려 온 경쟁 우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인재 확보를 꼽으며, 과도한 안보 프레임이 인재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도 AI 인재 쟁탈전은 유럽(EU), 일본(Japan), 싱가포르(Singapore) 등 주요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출신 연구자 유입을 크게 제한할 경우, 이들이 캐나다(Canada), 영국(UK) 등 다른 영어권 국가와 아시아·유럽 허브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미국 주요 매체 역시 미중 디커플링이 연구 인력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지적하며, 안보와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 경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미국이 중국인 AI 인재를 포함한 글로벌 연구자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할지 여부가 향후 AI 패권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전망한다. 동시에 연구 현장의 안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규제 방향과 그에 따른 인재 이동, 그리고 AI 연구 협력 구조의 재편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