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찾은 자폐 신경 바이오마커”…한국뇌연구원, 뇌 과잉연결·유전자 변화 규명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뇌영상 분석을 활용한 신경생물학적 원인 규명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시도되며, 조기 진단 및 치료 전략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 기능 이상과 유전적 요인을 통합한 분석이 차세대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뇌연구원 인지과학 연구그룹 정민영 박사와 일본 후쿠이 의대 공동연구진은 9월 10일, 국제학술지 ‘Translational Psychiatry’에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AI 기반 다차원 분석을 적용해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감각 관련 행동지표, 그리고 후성유전학적 정보를 통합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국내외 ASD 환자 및 정상 대조군 106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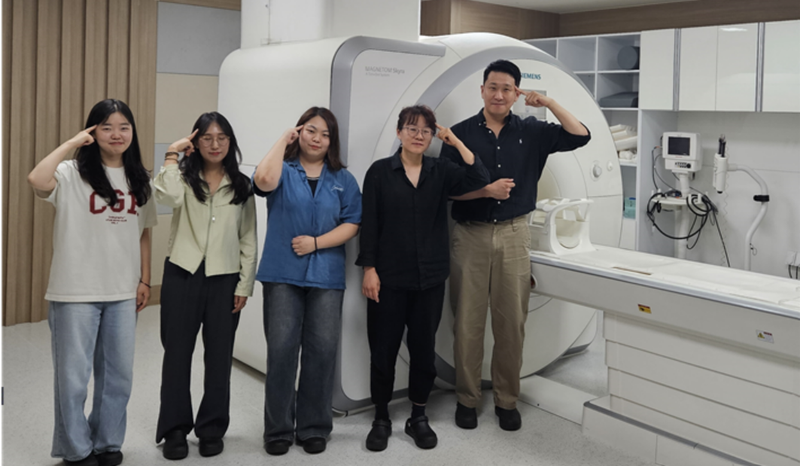
분석 결과, ASD 환자 집단에서 시상과 피질 간의 신경연결성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과잉연결(hyperconnectivity)’ 현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뇌의 시상-피질 회로에서 외부 감각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뇌신경 연구·산업계에서는 “정확한 신경표적 진단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메디컬 시장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AI 기반 유전 분석에서는 기존에 주목받던 옥시토신 관련 유전자 이상이 아닌,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Vasopressin Receptor)의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ASD 환자의 감각 이상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임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민영 박사는 “바소프레신 수용체 기반 진단은 치료 타깃 다변화에도 기회를 열 수 있다”며 파급 효과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AI와 다차원 빅데이터를 접목한 뇌질환 진단 플랫폼이 향후 신약 개발, 뇌영상 의료기기, 유전체 분석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바이오헬스 산업계에서는 관련 특허 확보, 신기술 인증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할 태세다.
정책 측면에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뇌질환 분야 AI 융합연구와 조기진단 기술 상용화에 R&D 예산 확대를 공언하며 뇌바이오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도 “차세대 바이오마커 발굴이 미래 진단 및 헬스케어 플랫폼 주도권 확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뇌영상 데이터와 유전자 분석의 융합은 최근 10년간 글로벌 바이오 신사업에서 연구개발(R&D) 투자액과 논문 수 기준으로 매년 10% 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분야다. 이번 성과 역시 국제학술지에 동시 게재되며 국내 바이오산업 연구 기반 확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구진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객관적 진단 및 중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바이오마커 활용이 미래 헬스케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기술 상용화 여부는 진단 정확도 검증, 투자 확대, 표준화 작업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