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해외 제조소 불시 검사 확대”…바이오 업계 비상 걸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 불시 검사 정책이 전격 강화된다. 세계 바이오·제약 업계는 실시간 품질 관리와 적극적 대응이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정책 변화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임상시험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국제 시장 공략의 판도가 변화할 수 있는 ‘규제 경쟁’의 분수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릴랜드 기술위원회 바이오 혁신 컨퍼런스에서 FDA 국장 마티 마카리는 “외국 의약품 제조현장에 대해 미국 내 시설과 동일하게 예고 없이 실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관행이던 해외업체 사전 통지 실사 방식을 ‘농담’이라 표현하며, 외국 기업 역시 국내 기업만큼 엄격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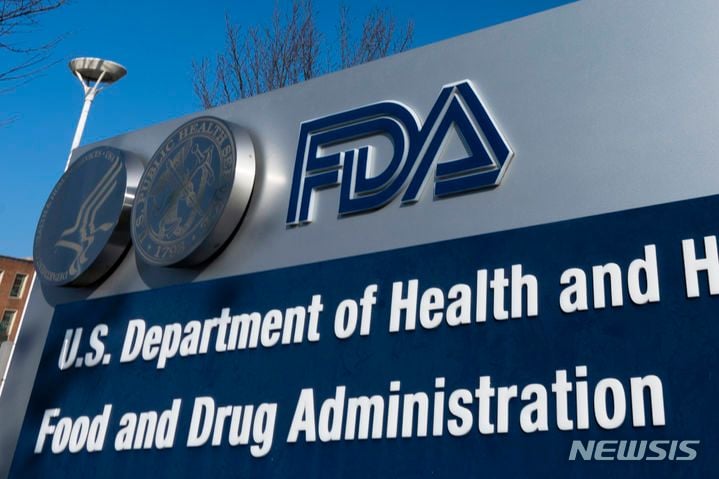
FDA의 불시 실사는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검증하는 감시 활동이다. 기술적으로, 미국 내 시설에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해외 시설은 일정 통보 후 인력이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동일 기준 미적용, 공정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카리 국장은 “해외기업들은 미국 업체보다 훨씬 가벼운 검사를 받아왔다”며 현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번 정책 변화로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업(CRO)인 파렉셀 등은 업계 전반에 ‘사전대비 강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파렉셀에 따르면 FDA가 90개국 이상에서 매년 약 3000건에 이르는 해외 제조 현장 검사를 실행 중인데, 앞으로는 ▲정례 모의점검 ▲대응계획 마련 ▲문서·기록 실시간 관리 ▲현장직원 교육 ▲공정 변경의 완전 통제 등 준비체계가 없으면 불이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품질정보 전산화 및 원격감사 준비, GMP(우수제조관리기준) 기준 초강화 조치도 본격 확대되는 흐름이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이외 유럽, 일본 등도 점차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경쟁국 대비 대응 속도와 실제 ‘차별 없는 실사 대응력’이 시장 진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반면, 해외 식약처와의 인증 이중관리, 현장 인력 수급, 시스템 투자 비용 증가 등 정책 격차에 따른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FDA의 불시 검사 강화는 국내외 제약·바이오사 품질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대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중견 바이오기업도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로 글로벌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바이오·제약 산업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지에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