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이 마주한 소년원 오후”…교육에 지운 책임, 방치된 소년들→구원의 실마리는 어디에
교실 한구석에 모여든 아이들의 눈빛은 벽 너머로 이어진 긴 겨울을 품고 있었다. KBS1 ‘시사기획 창’은 매번 뉴스 헤드라인 너머로 묻혀 온 촉법소년과 소년범 이야기에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사회의 끝에서 끊임없이 표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소년원이란 공간에 모였는지, 그리고 학교와 가정이 놓친 마지막 보호의 선에서는 무엇이 바람처럼 빠져나갔는지 곱씹게 했다.
실제 소년원 열 곳 가운데 여섯 곳이 수용 정원을 넘어서 있었고, 응답자 대부분은 이미 가정 해체의 아픔을 품은 채 돌아갈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의 이별, 자주 반복된 불안정한 보호환경은 이들의 일상을 잠식했고, 조기 학업 중단과 심각한 폭력의 상처가 내면을 더욱 황폐케 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무렵, 학교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급증하며 비행과 탈선의 일상이 반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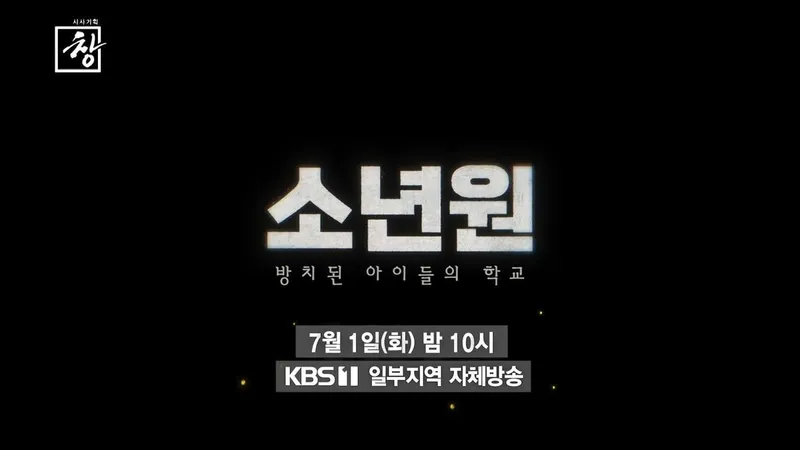
아이들은 구금과 등굣길의 경계에서 표류했다. 소년원이 교육의 마지막 촘촘한 그물을 펼치려 애썼으나, 실제로 전국 소년원 열 곳 중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교사 부족 탓에 맞춤형 교육이란 단어는 멀게만 남았다. 무너진 교육의 빈자리는 불안만 더욱 키웠고, 사회 복귀 후에도 적응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선 또 한 번의 죄와 고통이 이어졌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35년간 쌓인 소년범죄 기사에는 사실보다 9배나 많은 자극적 언어와 과장이 섞여 있었다. 극소수 흉악범죄가 소년 전체의 얼굴이 됐고, 언론과 사회는 혐오를 쉬이 걷어내지 못했다. 보호의 자리가 비워진 현실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범죄자’로만 남았다.
하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소년원에서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달랐다. 학교와 사회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제2의 기회를 쥐여주는 것이 결국 재범률을 절반가량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교육에 투자한 비용만큼 사회적 손실도 줄어들었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았기에 한국 소년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실었다.
‘시사기획 창’은 소년원이라는 공간에 깃든 구조적 한계와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에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소년범죄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방치와 혐오의 역사가 만든 공동의 상흔임을 환기시킨다. 아이들의 변화와 사회의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지, 그 묵직한 고민이 오늘 밤 10시 KBS1을 통해 계속된다.
개성 넘치는 기자와 제작진이 촘촘히 파고든 ‘시사기획 창’은 소년범죄에 대한 통념을 뒤흔들며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과 반성을 남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