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섭식장애의 민낯”…김민주·김주영, 뼈마름 집착에 감춰진 절규→치료 공백 경고
아이들은 오늘도 숫자에 집착하며 굶주린 심신으로 하루를 견딘다. ‘추적60분’은 점점 어려지는 섭식장애 발병 연령과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의 진실에 다가서며, 청소년 김민주와 김주영이 직접 털어놓는 고독한 일상에서 천천히 뭉클한 파문이 이는 장면을 포착했다.
18세 김민주는 정해둔 음식 외에는 먹지 못하고 스스로 구토를 반복하는 불안과 강박의 나날을 살고 있다. 김주영도 “살이 찌지 않는 그 중독이 있다”고 고백한다. 씹고 뱉는 것, 먹자마자 토하는 것, 절제와 충동 사이를 오가며 헤매는 한 끼의 식탁. 성장기의 몸은 필수 영양분이 결핍돼 위태롭고, 뇌와 심장, 신장까지 영향을 받는다. 손끝에 남는 상처가 증명하듯, 계속되는 구토가 남긴 흔적은 견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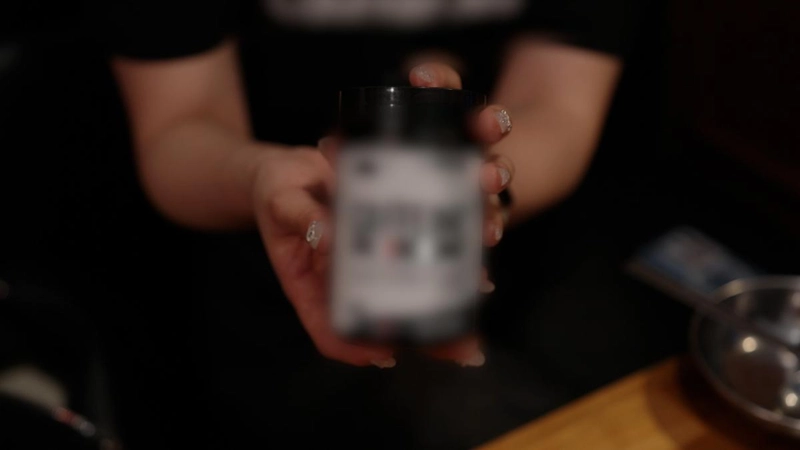
전문가들은 ‘뼈마름’ 신드롬과 먹방 등 SNS에서 퍼지는 양가적 문화, 그리고 주변 또래의 칭찬이 집착과 질병을 더 자극한다고 경고한다. 사회는 여전히 ‘다이어트’와 ‘의지 부족’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녹슬지 않은 고통의 근저에는 가정 폭력, 따돌림, 입시 압박 등 복합적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1만 3천여 명이 섭식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환자는 15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치료의 문턱은 더 높다. 사회적 낙인, 편견, 불신은 이미 환자들을 진료실 밖에 머물게 만들었다. 20년 전부터 극심하다고 경고돼온 치료 환경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입원 시설은 사라지고 전문 인력도 이미 등을 돌린 현실에서, 김율리 교수는 “치료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진단만 이뤄진다면 완치율이 80%에 이른다 해도, 해결의 주체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날 ‘추적60분’은 일본의 대책을 통해 섭식장애에 대응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짚는다. 동시에 한국 사회가 침묵해온 치료 공백과 오랜 시간 방치된 제도의 그늘을 여실히 드러낸다. 멈춰 선 성장기 아이들의 그림자 위로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가만히 덧씌워진다.
추적60분 1418회 ‘섭식장애,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7월 11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