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뇌파로 생각을 읽는다”…일본, 마음해석 신기술 공개로 의료계 촉각
AI가 인간의 심층적 사고를 읽어내는 기술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 NTT 통신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비침습적 뇌 영상 촬영만으로 머릿속 생각을 분석해 텍스트로 바꿔주는 ‘마인드 캡션’ 기술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 뇌졸중 등으로 언어 소통이 힘든 환자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간 두뇌가 세상을 인지하는 원리 해석에도 광범위한 활용이 점쳐진다. 업계는 이번 연구를 AI 기반 의료·생명과학 혁신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사생활 침해 논란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진이 이번에 공개한 마인드 캡션은 뇌 활동 패턴을 딥러닝 기반 언어 AI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비침습식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참가자 뇌를 실시간 촬영한 뒤 AI가 미리 학습한 2000개 이상의 비디오 캡션 의미 구조와 연관성을 분석했다. 각 문장은 고유한 ‘의미 서명’(meaning signature)으로 환산되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뇌 신호의 패턴을 해독해 텍스트 결과로 제시한다. 기존 기술들이 핵심 단어 추출에 머물렀던 반면, 이번 연구는 실험 참가자가 비디오를 볼 때 생기는 복잡한 줄거리·행동까지 문장 단위로 추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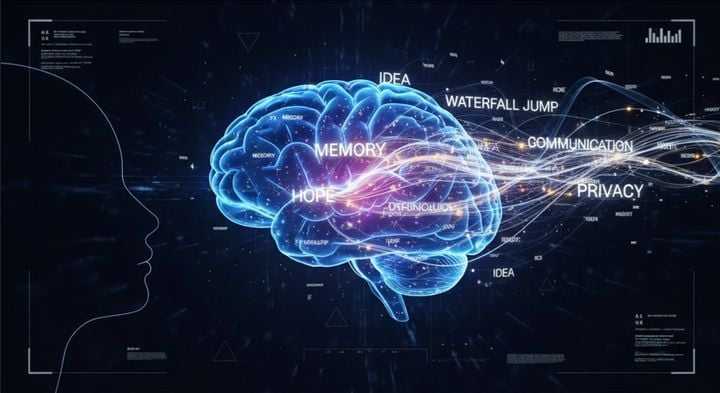
현장 실험에선 참가자가 ‘폭포에서 사람이 뛰어내린다’와 같은 장면을 볼 때, AI는 100회 이상 추론을 반복해 ‘산등성이 폭포 위에서 사람이 점프한다’는 수준에 달하는 서술도 도출했다. 나아가,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장면 역시 뇌 신호로부터 상당히 정확한 문장으로 전환했다. 즉, 뇌가 실제로 정보를 지각할 때뿐 아니라 상상하거나 추억할 때도 유사한 데이터 패턴을 보인데다, 이를 AI가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의료 현장에선 뇌졸중·ALS(루게릭병) 등 언어 표현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대뇌피질 이식 등 수술적 방식이 아닌 비침습 단기촬영만으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의 의사 표현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향후 텍스트 변환 정확도와 모델 속도 개선이 이뤄지면 맞춤형 의료 커뮤니케이션 시장 개척도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AI·신경과학 연구소들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및 언어 해독 기술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뉴럴링크, 프랑스 CEA-Leti 등도 유사 솔루션을 상용화 단계로 추진 중이나, 이번 마인드 캡션처럼 비침습적 접근으로 복수의 문장·줄거리까지 재현한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개인 뇌 데이터의 민감성 문제는 논란의 불씨다. AI가 뇌파 패턴에서 개인의 감정·사상·건강 정보를 추론할 경우 정보 악용, 감시, 차별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연구자인 UC버클리 알렉스 후스 박사는 “정신 사생활 이슈가 부상할 수 있으며, 법·윤리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NTT 연구진 역시 ‘참가자 동의 기반의 제한적 해석 기술’을 강조했으나, 전면적 상용화에 앞서 각국의 윤리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제 프로세스가 보완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AI 뇌 해독 기술이 의료 및 신경과학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 마련이 산업 성장의 조건”이라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신기술의 실제 시장 안착과 사회적 수용력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