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가 통증을 쾌감으로 바꾼다”…메이드카페 논란에 뇌과학 해석 주목
뺨 맞기, 회초리 등 이색 서비스가 논란이 된 메이드카페 논쟁이 생물학적·뇌과학적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증이 항상 부정적인 경험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맥락과 뇌의 통제 인식에 따라 쾌감이나 긴장 해소로 전환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사례를 두고 통각과 쾌락 신경회로의 교차 작용, 통제감의 중요성 등 ‘뇌의 맥락적 통증 조절 현상’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단면을 보여줬다고 해석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루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마조히스트의 통증에 대한 맥락적 조절’ 논문에서는 역할극 등 안전하게 설정된 상황에서의 통증이 일반적인 통증과는 달리 뇌의 감정적 고통 처리 영역(섬엽 등)은 덜 활성화되고, 감각적 통증 부위가 상대적으로 더 활동함을 밝혔다. 연구진은 “통증이 ‘통제 가능한 자극’임이 확인되면 뇌가 이를 덜 위협적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도파민, 엔도르핀 등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돼 불안과 긴장 완화, 일시적 쾌감 유발과 같은 현상이 동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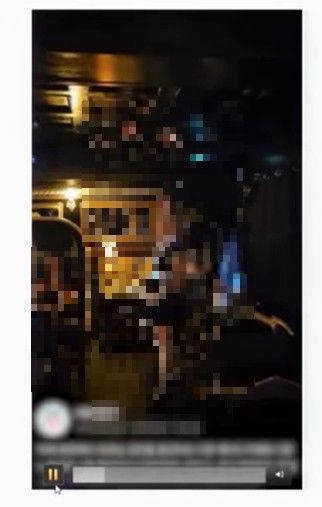
실제로 뇌는 통증 신호를 처리할 때 컨텍스트(상황적 맥락)와 자기 통제 여부를 중시한다. 위험성이 낮고, 스스로 경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뇌에 입력되면, 신호 자체를 ‘위험’이 아니라 ‘체험’으로 재해석한다. 국내외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맥락적 조절은 오피오이드계(신경 전달 물질 계통)와 도파민계가 함께 작동해 통증과 쾌감의 경계를 흐린다. 메이드카페에서의 맞기 등 가벼운 자극 역시 ‘안전 환경+본인 선택’이 결합될 때 불쾌감보다 일종의 ‘놀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뇌과학적으로 해석된다.
정신의학 전문가들 역시 “질병이나 중독으로 단정하기보단, 충동 조절장애 등과 구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나 타인 피해, 자신에 대한 해가 없다면 일시적 놀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 자극 의존이 반복될 경우, 혹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하나로만 고착된다면 전문적 상담 필요성이 커진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을 통해 개별 소비 환경에서의 행동 특징과 뇌 기반 인지노동을 분석해, 서비스 기획·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고도화와 인간 행위의 신경과학적 해석이 맞물리는 접점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기술과 윤리, 제도와 사회적 수용성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