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AI로 판 흔든다”…중국-미국, 글로벌 표준 주도권 경쟁 가열
현지시각 기준 12일, 미국(USA)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China) 주요 IT 기업들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채택 확대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및 정책 당국에 전략적 충격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중국 딥시크(DeepSeek), 알리바바(Alibaba) 등 대형 테크기업들의 오픈소스·오픈 웨이트 AI 모델 도입이 국제적인 기술 표준 경쟁의 판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올해 1월 R1 모델을 내놓았고, 알리바바는 7월 이후 큐원(Qwen) 등 다양한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를 출시해 국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학습된 파라미터를 공개해, 개발자들이 목적에 맞게 AI를 자유롭게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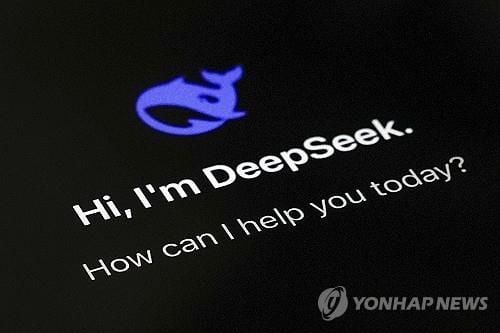
이와 같은 중국발 개방형 AI 확산으로, 미국 대표 업체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오픈AI(OpenAI)는 기존 폐쇄형 전략에서 처음으로 ‘GPT-oss-120b’와 ‘GPT-oss-20b’ 등 오픈 웨이트 모델을 공개했고, 업계에서는 오픈AI의 방침 변경이 중국 AI 모델 약진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WSJ는 접근성·유연성이 글로벌 표준 채택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식 오픈소스 AI 전략’이 미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도 AI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백악관은 ‘오픈소스 AI 모델이 학술·산업 표준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며, ‘미국의 가치와 투명성을 반영한 오픈소스 AI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AI,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서 오픈소스 연구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기술 의존도 축소와 자립 강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 리안 졔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대중 기술 차단에 대비해 중국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사와 대기업들도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 오버씨-차이니스뱅킹(OSBC)은 구글(Google) 젬마(Gemma), 알리바바 큐원, 딥시크 R1 등 약 30종의 오픈소스 AI를 다양한 사내 업무에 맞춤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개발자들은 중국 AI의 현지 언어·문화 맥락 이해가 우수하다는 차별성을 꼽고 있다. 일본(Japan) 요코하마의 한 개발자 역시 “알리바바 모델이 영어권 기반 미국 AI보다 일본 이용자 뉘앙스 파악에서 뛰어나다”고 밝혔다. 리서치 기업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성능 평가에서 중국 주요 오픈 웨이트 모델이 코딩·수학 등 분야에서 미국 대표 모델을 뛰어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AI는 오픈AI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은 만큼, 더 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한계도 있다.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업체는 오픈AI 모델의 비용 효율성을 부각하며 자사 인프라 최적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WSJ는 “오픈소스 AI는 단기간 대규모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많은 사용자 기반을 토대로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 확장 등 시장 선점을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성장 전략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86리서치의 찰리 차이 애널리스트는 “중국 IT기업들은 당장 수익보다는 고객 충성도를 더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의 오픈소스 AI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표준 선택과 AI 시장 구조 재편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쟁이 향후 AI 기술 패권과 규제 질서, 글로벌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