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확대”…국가AI위원회 정책 조정권 강화
AI 기술 고도화와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조율하고 전략을 이행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부처 AI 전략·정책과 사업 조정, 이행 관리의 총괄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수립과 이행체계 효율화는 물론, 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전방위적 국가 AI 거버넌스가 구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를 ‘AI 국가경쟁력 체계 구축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AI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조율·점검하는 핵심 기구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심의·의결 항목에는 국가 AI 비전, 중장기 정책 전략, 부처간 사업 조율, 이행점검·성과관리, AI용 데이터 구축·활용까지 포함돼 정책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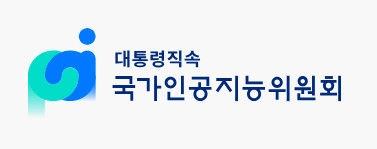
위원회 구성 역시 전면 개편된다. AI 분야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두기로 했으며,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명문화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간 보장된다. 정부위원에는 기존 7개 부처 외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돼, 실질적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 ‘AI책임관협의회’도 신설된다. 각 부처 차관이나 광역단체 부시장·부지사 등을 AI책임관으로 지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이행력과 현장 연계를 높인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실행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강화는 글로벌 선진국의 AI 거버넌스 체계와 비교해도 범정부적 접근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미국·유럽연합은 이미 국가전략 차원의 AI 위원회를 두고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추세다.
고도화되는 AI 기술 환경은 데이터 활용, 정책 일관성, 산업 육성, 윤리 및 규제 조율 등 복합적 과제를 동반한다. 실제로 정부는 AI책임관 제도 도입과 함께, AI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여건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 운영과 이행의 투명성, 민관 협력 기반 확장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전략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신호”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계는 국가AI위원회의 강화된 역할이 산업 현장, 데이터 생태계, 규제 혁신 등 다층적 효과를 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정책 집행과 산업 구조 혁신이 얼마나 맞물릴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기술 발전, 사회적 영향, 제도적 지원이 균형 잡히는 국가 AI 전략 구심점으로 자리잡을지 이목이 쏠린다.
